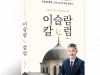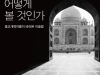오해와 진실 - 토마스 선교사의 생애와 순교에 대한 고찰
유해석(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주임교수)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이자 순교자인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의 생애와 순교를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다루지 않은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재조명한다. 이를 통해 토마스를 둘러싼 다양한 오해와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그의 선교 동기와 선교 사역, 그리고 순교의 역사적 의미를 실증적으로 규명한다. 토마스는 한국 근현대사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미국, 일본, 중국, 북한의 정치적 상황에 의해 제각기 다르게 서술되고 이용되었다. 이에 따라 초기 한국교회에서 토마스에게 주어졌던 순교자의 정체성은 왜곡되거나 과장되거나 희석되었다. 토마스의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제너럴 셔먼호와의 관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토마스와 제너럴 셔먼호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고찰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다. 토마스에 대한 평가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일어난 17일 간의 상황이 아닌 그의 생애와 당시의 국제정치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사료적 재해석을 통해 토마스에 대한 기존의 평가와 오해를 바로잡고, 한국 기독교사에서 그의 순교가 갖는 선교신학적·역사적 의의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제어 : 토마스, 제너럴 셔먼호, 순교, 장계, 한국교회.
I. 서론
2026년은 1866년 대동강 변에서 순교한 런던선교회 소속의 웨일즈 출신 선교사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 1839-66)의 순교 160주년이 되는 해이다. 그러나 토마스에 대한 평가는 일치되지 않는다. 학계에서는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 서해안 지역에서 복음전파를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인정하나, 그의 순교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들 사이에서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는 한국교회 역사라는 맥락에서 다음의 세 가지 접근 방식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 견해는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를 한국에서의 개신교 선교사 중 최초의 순교자이자 신앙의 선구자로 본다. 이 관점을 가진 학자들로는 오문환과 그의 연구를 계승한 김양선, 이찬용 등이 있다. 이들은 토마스의 선교에 대한 열정, 희생적인 마음과 순교 정신에 초점을 맞추며,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있어서 토마스는 단순한 승객이었고 제너럴 셔먼호의 초기 의도는 해롭지 않았음을 강조한다.
두 번째 견해는 토마스가 열정적인 선교사였음은 인정하지만, 토마스를 최초의 순교자로 인정하는 것에는 회의적이다. 이 관점을 가진 학자들로는 이만열, 한규무 등이 있다. 그들은 토마스가 순교라는 고귀한 목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이 아니라 잘못된 판단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며, 그의 순교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전설이라고 주장한다.
세 번째 견해는 앞의 두 견해 모두와 상충된다. 고무송과 민경배는 토마스의 선교사로서의 진정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지만, 토마스가 그의 단점인 불안정하고, 충동적이며, 진지하지 못한 성향으로 인해 제너럴 셔먼호의 본질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다고 본다. 이 학자들은 토마스를 영웅으로 보지 않으며, 오히려 그를 성급하고 어설픈 사람으로 묘사함으로써 제너럴 셔먼호와 관련된 그의 역할을 비판한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토마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이유는 역사적 증거의 상대적 부족과 데이터의 일관성 결여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마스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국•내외 자료들과, 토마스의 죽음에 관한 최초의 기록이었으나 선행연구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자료인 『장계』(狀啓), 그리고 영국 웨일즈에 살고 있는 토마스 후손들로부터 직접 수집한 자료들을 사용하여 연구의 객관성을 보강할 것이다.
토마스는 영웅적인 순교자였는가, 제국주의적인 선교 활동으로 조선을 문명화하려던 선교사였는가? 자신의 열정에 눈이 멀어 제너럴 셔먼호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탑승한 무모한 선교사였는가? 조선의 법을 무시하고 외국 세력에 기대어 입국을 시도한 침략자였는가? 이러한 지속적인 질문과 논쟁 속에서 본 연구는 토마스에 대한 평가를 그의 죽음의 순간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의 생애와 선교활동, 그리고 조선 입국의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학문적인 관점에서 재평가하고자 한다.
II. 역사 서술에서의 오해
1882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의 결과로 조선과 미국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며 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평가가 조선과 미국 간의 국제 관계 상태에 따라 변화되었다. 여기에 일본과 북한의 입장들이 얽히며 토마스에 대한 기록과 평가는 정치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되었다.
1.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 근거한 토마스에 대한 오해
토마스를 연구한 첫 번째 학자는 백낙준이었다. 그는 1927년 예일대학교에 제출한 박사 논문 《한국 개신교 선교사 역사 1832-1910》에서 토마스를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잘못 언급했을 뿐 아니라 토마스의 출신 학교를 에든버러 대학교의 뉴칼리지(New College)로 잘못 기재했다. 이 오류는 약 40년 후인 1970년 민경배가 런던에서 정확한 자료를 발견하면서 수정되었다. 이로 인해 토마스는 한국 교회에서 오랫동안 스코틀랜드 출신으로 기술되었다. 게다가 고무송이 토마스의 출생연도를 1839년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한국 교회 역사에서 그의 출생연도는 1840년으로 기록되었다. 신뢰할 수 없고 부정확한 출처들로 인해 토마스는 한국 교회사 초기부터 잘못 이해되었다.
2. 토마스를 영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오해
1926년 9월 3일 오문환은 《조선 기독교사의 일분수령인 평양양난》(‘외국 사건: 한국 교회 역사에서의 분수령’)이라는 책을 썼고, 그 이야기를 전국의 모든 교회에 퍼뜨렸다. 오문환은 토마스가 사망한 평양 지역에 거주하면서 사무엘 마펫(Samuel A. Moffett, 1864-1939)에게 영어를 배웠고 평양의 장로교 여자학교에서 가르쳤다. 그의 아버지가 토마스가 나눠준 성경을 통해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오문환은 토마스를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1932년 그는 《토마스 목사 전》(‘1866년 평양에서 살해된 R. J. 토마스의 생애’)을 출판하며 토마스의 순교를 알렸다. 당시 교회는 일본의 통치하에서 부흥하고 있었고, 기독교는 많은 조선인들에게 일본 식민지화의 억압에 대한 대안이 되었다. 토마스가 순교자 영웅으로 지정됨으로써 그는 조선 기독교인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가 되었다. 오문환의 기여는 적절하게 인정되고 있지만, 그의 작업은 토마스를 장로교 목사로 묘사함으로써 진실을 왜곡했다.
3.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이전의 오해
일본은 1931년 만주를 점령한 후, 선전포고 없이 천진과 북경을 점령하고 세력을 상해까지 확장하였으며, 마침내 1937년 중일 전쟁이 발발했다. 1939년 일본은 중국의 10개 성을 정복한 후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미국의 침략 시도라고 주장하며 태평양 전쟁을 정당화하려 했다. 또한 조선인을 일본군에 징집하기 위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
1937년 중일 전쟁이 시작되고 1939년 초 일본 정부는 외국 선교사들의 기념행사를 전면 금지했고, 그 결과 복음 전파 활동은 중단되었다. 그동안 토마스를 기념하기 위해 그의 이름을 따랐던 교회는 마을의 이름을 따라 조왕리로 변경했다. 안타깝게도 토마스를 파송한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이사들이 보낸 기념비의 비문은 지워졌다. 태평양 전쟁, 이른바 대동아 전쟁이 시작되면서, 복음의 전사이자 개신교 선교사의 첫 순교자인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목사는 침략의 선봉으로 묘사되며 선동의 도구로 사용되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토마스의 생애는 1945년 해방 시까지 왜곡된 채로 남아 있었다.
4. 북한에 의한 토마스에 대한 오해
북한에서 발행된 『조선 역사』는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상세히 다루면서 토마스를 미국인 선교사로 소개한다.
적군(제너럴 셔먼호)의 총격과 포격에도 불구하고, 자살 공격대는 정오에 마지막으로 불로 공격했다. 그 부대의 지휘관은 김일성의 고조할아버지인 김응우였다. 그는 작은 배를 묶고 배 위에 마른 나무를 얹고 유황을 뿌려 배가 모래에 걸려 불타고 있는 제너럴 셔먼호를 향해 강을 떠내려가도록 명령했다. 결국 적군은 배가 불타고 침몰 직전에 이르자 싸움을 포기했다. 배에 실려 있던 전력 저장 장치가 폭발했다. 폭발은 엄청난 소리를 내었고 검은 연기가 평양 하늘을 뒤덮었다. 승무원 24명 중 13명은 불에 타 죽었고, 나머지는 강에 뛰어들어 강변으로 헤엄쳐 갔지만 모두 죽임을 당했다. 토마스는 그의 친구와 함께 불타는 배에 있었다. 그는 분노한 조선인들에 의해 그의 친구와 함께 살해되었다. 오만한 제국주의 미국의 적들이 조선인들에 의해 모두 죽임을 당했다. 이것은 조선인들에 의한 심판이어야 한다.
김일성을 우상화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당시 아홉 살에 불과했던 그의 고조부인 김응우를 제너럴 셔먼호를 물리친 열렬한 투사로 선전했다. 김일성은 이 신화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가족을 영웅적으로 부각시켰다. 북한의 역사에서 토마스는 영국인이 아닌 미국인으로 잘못 묘사되었다. 지금도 북한은 제너럴 셔먼호가 침몰한 장소에 미국 군함 푸에블로(Pueblo)호를 전시하고 제너럴 셔먼호 승리에 대한 기념비를 세워 놓고 있다. 이와 같이 토마스는 한국 근현대사의 격변기를 거치면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제각기 다르게 서술되고 이용되었다.
III. 자료 수집과 사용에서의 왜곡과 오해
토마스 선교사에 대한 연구는 제한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왜곡된 내용이 포함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누적 현상은 토마스에 대한 오해를 낳는 요인이 되었다.
1. 오문환에 의한 토마스의 신화화
한국에서 토마스에 대한 최초의 연구자는 1926년에 그의 책을 출판한 오문환이었다. 그는 토마스에 관한 책을 집필하기 위해 ‘주로 영국과 중국에 있는 친척 및 친구들에게 보낸 3천 통 이상의 편지’와 ‘한국의 황해도, 평안남북도 해안지역에서 그를 만났던 200여명의 노인들’을 연구했다. 책의 서문에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토마스에 대해 들었고, 책을 집필하기 위해 8년 동안 연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그림을 시작하기 전에 상상했던 것에 맞춰 토마스의 초상화를 그렸다. 그는 주로 자신이 원하는 색상과 한국 교회들이 원하는 색상으로 초상화를 칠했다. 최종 결과물은 그의 죽음과 조선에서의 사역에 관련된 사실들에 근거한 한국 개신교회 신화의 영웅이었다. 보다 이상적인 모습이 아니라 더 현실적인 초상화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여러 층의 색을 제거해야 한다. 그의 견해를 입증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의 책은 국내 기독교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이후에 여러 권의 책을 더 출판했다. 고무송은 오문환에 관한 그의 책에서 토마스가 의도적으로 우상화된 일곱 가지 내용을 지적했다. 그는 『도마스목사전』(1928)이 허구적 표현, 터무니없는 해석, 검증되지 않은 증언으로 인한 결함이 있다고 주장했다. 오문환이 토마스 순교기념전도회의 총무로서 저지른 가장 심각한 실수는 자신의 글에서 사실을 왜곡한 것이다. 첫 번째 책에서 그는 출판 목적이 네 가지라고 밝혔다. 첫 번째 목적은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토마스가 한국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이자 신앙의 선구자임을 밝히는 것이다. 두 번째 목적은 토마스 목사가 장로교 소속 목사였으며 개척 선교사로 조선에 와서 한국 개신교회의 창립자가 되었다는 것이다. 오문환은 자신의 배경과 경험으로 인해 토마스를 장로교 목사로 묘사했다. 그는 1903년 평양 출생으로 장로교 선교사였던 마펫에게 영어를 배우고, 마펫이 설립한 숭실중학교와 숭실대학을 졸업한 후 숭실대학과 평양신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쳤다. 토마스에 관한 책 출판에 종사하면서 그는 1927년 마펫이 결성하고 주관한 토마스 순교기념전도회의 총무가 되었다. 또한 당시에는 회중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했다. 조선에 파송된 일본 회중교회의 목사들은 일본의 국익에 헌신했는데 이러한 상황들은 조선인들 사이에서 개신교에 대한 반감을 키우는 결과를 낳았다. 회중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토마스에게 적용되면 그의 영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었다. 따라서 오문환은 토마스를 장로교 목사로 묘사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2. 토마스에 관한 이전 연구들의 한계
오문환과 백낙준의 토마스에 대한 연구에 관한 논평들은 이미 존재한다. 토마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런던의 뉴 칼리지에서 수행한 또 다른 연구자는 한국 교회 역사가인 민경배였다. 그의 책 서문은 다음과 같다.
백낙준은 1927년 예일대학교 역사학과에서 “한국 개신교 선교의 역사 1832-1910”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가 스코틀랜드 출신이며 에든버러의 뉴 칼리지에서 졸업했다고 잘못 기술했다. 이 주장은 약 40년 동안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며, 이 저자가 런던에서 귀중한 역사적 자료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백낙준 이후 한국 교회들은 이 주장을 사실로 받아들였다. 민경배는 토마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했으나 그의 논문은 한국 책의 형식을 따르는 29페이지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는 영국에서의 짧은 체류 결과로 작성된 것이었다. 1970년 이후 나동광은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목사의 생애』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는 오문환과 백낙준의 연구를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의 연구는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한 초기 논문으로서 의미가 있다. 1984년 민병호는 『R. J. 토마스 목사 연구』를 출판했다. 그의 연구는 일본 통치 이후 한국에서 시작된 토마스의 삶과 활동을 회중교회 연구와 연결시켰다. 고무송의 논문은 뛰어났으나 그의 연구는 기본적으로 민경배의 관점을 따랐다. 따라서 영국에 초점을 맞추었고 토마스의 웨일즈 뿌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만열은 그의 저서 『한국 교회의 100년』에서 토마스에 대해 간략히 언급했다. 그는 토마스의 죽음을 순교로 묘사하는 견해에 처음으로 의문을 제기한 역사학자였다. 그 후 김승태는 한국 정부의 기록을 검토하고 토마스의 마지막 세 편지를 번역하면서 토마스의 죽음을 순교로 보는 관점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한규무는 논문에서 조선에서의 토마스와 관련된 모든 문헌을 검토하면서 토마스의 순교에 대해 질문을 제기하였다. 토마스의 순교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는 대개 그의 조선 체류 중 행동 문제를 다룬다. 그러나 이것은 오문환이 범한 실수를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토마스의 죽음은 제너럴 셔먼호 사건과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 작성된 자료에만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많은 오해와 역사적 왜곡을 초래했다.
IV. 토마스의 생애와 중국 선교
토마스의 마지막 죽음은 그의 전 생애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특히 선교사로서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선교적 열정으로 살아간 토마스의 삶의 자취를 특히 선교사역과 관련해 간략하게 고찰할 것이다.
1. 토마스의 가족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는 1839년 중부 웨일즈의 라노셔(Radnorshire) 주의 롸야다(Rhayader)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회중교회의 목사인 로버트 토마스(Robert Thomas, 1809-1884)이다. 토마스의 성장 배경이 되는 영국 회중교회는 역사적으로 칼빈주의 신학을 따랐다. 로버트 토마스는 남부 웨일즈 스완지(Swansea)의 실로 교회(Shiloh church)에서 사역을 시작하여 1837년 4월 19일에 안수를 받고 담임목사가 되었으며, 동년 5월 메리 윌리엄스(Mary L. Williams, 1817-1895)와 결혼했다. 둘째를 임신하고 건강상태가 약화된 부인의 건강을 위해 로버트 토마스는 중부 웨일즈의 롸야다(Rhayader)에 있는 교회로 옮겼고, 1848년에 잉글랜드와 웨일즈 사이에 위치한 몬머스셔주(Monmouthshire)의 하노버교회(Hanover)에 담임목사로 부임해 37년 동안 열정적으로 목회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를‘런던선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뛰어난 선교사’로 평가하며 아들의 죽음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2. 토마스의 학업과 선교 열정
토마스는 란도버리 칼리지(Llandovery College)를 탁월한 성적으로 조기 졸업하며 14살에 옥스퍼드 대학교 지저스 칼리지(Jesus college)에 장학생으로 합격했지만 비국교도였기에 입학할 수 없었다. 토마스는 2년간 외과 의사인 워터만 박사(Dr Waterman)에게서 교육을 받았으나 목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의학을 포기했다. 이후 회중 교단에서 운영하는 런던대학교의 뉴 칼리지(New College)에 입학하기 전인 1856년 말, 토마스는 하노버교회에서 첫 설교를 시작했고, 하노버교회를 중심으로 노방전도 활동을 전개했다. 사무엘 휴 마펫(Samuel Hugh Moffett)은 그의 저서 『아시아의 기독교 역사』(A History of Christianity in Asia)에서 토마스는 웨일즈의 교회 공동체 속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설교하며 신앙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다고 기술했다. 아울러 웨일즈에서의 경험이 후일 그의 선교 사역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으며 복음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개혁주의 신앙을 견지하는 기반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1857년 9월 뉴 칼리지의 장학생으로 입학한 토마스는 런던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파송되기 위해 조기 졸업을 요청했다. 토마스는 뉴 칼리지에 입학할 때부터 런던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나가기를 희망하였으며, 학업 중에도 꾸준히 런던선교회의 지도를 받았다. 역사학자 라토렛(Kenneth S. Latourette)은 “토마스가 웨일즈를 떠나 런던에서 받은 개혁주의 전통에 따른 신학 교육은 그의 선교적 사명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었으며, 이로써 그는 복음의 전파를 위해 해외 선교지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다. 특히, 19세기 개혁주의 선교 운동의 흐름 속에서 그는 선교의 필연성과 복음의 보편적 확산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3. 토마스의 중국 사역
1863년 5월 29일 토마스는 캐롤라인 고드프리(Caroline Godfrey, 1834-1864)와 결혼했고, 두 사람은 동년 12월 9일 상해에 도착했다. 토마스는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현지 언어와 풍습을 충분히 익힌 후에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중국어 학습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상해에 도착한 지 4개월 후인 3월 11일부터 3주 동안 토마스가 한구(漢口)를 방문한 시기에 캐롤라인은 유산을 하고, 1864년 3월 24일 사망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주님은 나에게 고귀한 분입니다”였다.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토마스는 선교사로서의 책임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는 선교사가 강한 체력과 자기부인(自己否認)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토마스는 이후 8개월간 상해에 거점을 두고, 알렉산더 윌리엄슨(Alexander Williamson, 1829-1890)이 책임자로 있는 스코틀랜드 성서공회로부터 성경을 전달받아 중국인들에게 성경을 전달하는 권서인(勸書人)으로서 중국 내륙을 오가며 사역했다. 그러나 상해의 런던선교회 리더인 윌리엄 무어헤드(William Muirhead, 1822-1900)와 선교 전략에서 차이를 보이면서, 토마스는 상해를 떠나고 싶어 했고 중국에 도착한 지 1년 만에 런던선교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V. 제너럴 셔먼호와 토마스의 최후
토마스는 연대(煙臺)로 이동해 로버트 하트 경(Sir Robert Hart)의 추천으로 연대 세관에서 보조 통역사 직책을 맡았다. 알렉산더 윌리엄슨은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중국 책임자로 연대에 거주하며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권서인으로 성경배포사역을 하는 토마스의 재정을 지원했고 동시에 런던선교회에 토마스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줄 것을 제안했다. 런던선교회는 1865년 3월 14일 토마스의 사임을 수락하였다. 런던선교회 선교사로서의 직위는 내려놓았지만, 연대에서 선교 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심한 토마스는 통역사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으며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토마스는 다시 런던선교회에 허입을 요청했고 1865년 8월 22일 런던선교회에 재허입되었다.
연대에서 조선인들을 만나 조선에 대해 알게 된 토마스는 1865년 9월 4일 연대를 출발해 9월 13일 황해도 장연 부근에 도착하였다. 토마스가 서해안을 방문했다는 기록은 조선 정부의 기록인 『고종태황제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당시 그는 조선인들에게 성경을 무료로 배포했다. 이후 토마스는 북경에서 조선 정부와 함께 온 동지사 일행으로부터 전년도에 서해안에서 배포된 마태복음 한 권을 요청하는 메모를 받았다. 토마스는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조선어를 배우기 위해 노력했다.
사실 그는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하고, 그 어두운 땅에 개신교 선교를 세우기 위해 언어를 완벽하게 익히려는 목적으로 어떻게든 조선에 가고자 했습니다.
1866년 2월 조선에서는 천주교 박해가 재개되었다. 이 박해로 자국민들이 학살당한 것을 알게 된 프랑스 함대는 조선에 출정하려고 했다. 당시 토마스는 조선 방문의 경험이 있으며 프랑스어, 중국어, 약간의 조선어가 가능한 유일한 서양인이었기에 북경의 프랑스 프랑스 대사관으로부터 프랑스 함대의 통역관 제안을 받았다. 런던선교회 북중국 위원회의 책임자였던 에드킨스(Joseph Edkins, 1823-1905)는 이에 전적으로 동의했고 토마스를 돕기 위해 중국 학생이 함께 가도록 조치했다. 그 중국 학생은 토마스와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조능봉으로 보인다. 북경을 떠나 천진에 도착한 그들은 프랑스 영사 드 발로네(M. de Ballonet)의 편지를 받았다. 그 내용은 프랑스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인도차이나 반도 사이공에서 반란이 일어나 프랑스 함대가 홍콩으로 이동했으나, 한 달 후에 다시 돌아올 예정이라는 것이었었다. 그러나 토마스는 기다리지 않고 연대로 갔다. 윌리엄 그리피스(William E. Griffis, 1843-1928)에 따르면, 토마스는 연대에서 조선의 박해를 피해 온 리델 신부를 만난 후 조선에 들어갈 방법을 모색했다. 토마스는 평양으로 가는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승선을 선택했다. 1866년 8월 9일 토마스는 알렉산더 윌리엄슨으로부터 지원받은 기독교 서적을 가지고 런던선교회 소속 선교사이자 스코틀랜드 성서공회의 대리인으로서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하여 제2차 조선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다. 제너럴 셔먼호의 목적은 무역이었고 이는 조선 정부도 인지하고 있었다.
우리는 비단, 서양 면직물, 삼베 옷, 벨벳, 유리 제품, 망원경, 자명종 및 자동 연주 악기 등의 상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쌀, 금가루, 홍삼, 종이, 호랑이 가죽 또는 표범 가죽과 교환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함처럼 보일 수 있지만 평양에서 무역을 원합니다. 배와 화물의 소유주인 프레스턴 씨와 호가스 씨가 배에 탑승해 있습니다.
1866년 조선 연안 해역에는 외국 선박들이 눈에 띄게 많이 나타났다. 게다가 프랑스 함대가 프랑스 신부들이 처형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는 내용이 조선 정부에 전달되자 정부는 천주교인을 포함해 수상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국경 수비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반복적으로 내렸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너럴 셔먼호가 백령도 두무진을 거쳐 대동강 입구 주영포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제1차 조선 전도여행 때 항해사였던 유원태(Yu Won Tai)를 만나 그의 인도로 제너럴 셔먼호는 대동강에 들어섰다. 토마스는 유원태를 통해 조선의 정치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산동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으나 제너럴 셔먼호의 도선사가 평양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8월 17일 제너럴 셔먼호는 황해도 송산리에 이르렀고, 8월 20일에는 평안도의 장사포에 닿았다. 이곳에서 토마스는 사람들과 친분을 쌓으며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자신의 선교 비전을 실현하려고 노력했다. 『장계』에는 토마스와 주민들 간의 접촉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평안 감사 박규수는 공식적인 정부 조사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위해 정부 관리들을 관광객으로 위장시켜 8월 18일 오후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시켰다. 그들은 선박 내부 구조에 대한 정보를 보고하고, 토마스와의 대화를 서면으로 기록해 박규수에게 전달했다. 이러한 정황을 고려할 때 조선인들은 자연스럽게 제너럴 셔먼호에 오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토마스는 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누어 주었다.『평양기』에는 토마스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약성경과 책을 나눠주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또한 제너럴 셔먼호를 방문한 문정관에게 개신교의 진리가 천주교와는 다르다는 것을 설명해 주기도 했다. 조선 정부는 토마스가 개신교 선교사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정부 관리들의 관심은 제너럴 셔먼호라는 선박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너럴 셔먼호의 이동 경로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존재하지만 토마스 개인의 선교 활동에 대한 정부 기록은 남아 있지 않다.
8월 27일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 외국인 6명이 제너럴 셔먼호에서 하선해 작은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상류로 올라갔다. 중군 이현익은 박순영, 박지영과 함께 또 다른 작은 배를 타고 그들을 따라갔다. 이현익은 외국인과 조선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그들을 따라다니곤 했다. 그러던 중 제너럴 셔먼호의 선원들이 이현익과 두 명의 조선인을 납치하여 배에 억류했고, 하루가 지난 8월 28일 아침 제너럴 셔먼호는 상류로 이동하며 총과 대포를 발사하기 시작했다. 평양성의 주민들이 강변에 모여 이현익을 돌려보내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제너럴 셔먼호의 선원들은 성안으로 들어가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조선인들이 분노하여 돌을 던지기 시작했고, 성안의 군인들은 활과 총을 쏘았다. 외국인들은 작은 배를 버리고 제너럴 셔먼호로 돌아갔다. 오후 4시경 퇴역 군관 박춘권이 이현익을 구출했다.
박규수는 제너럴 셔먼호 승무원들을 포로로 삼으려 했으나 제너럴 셔먼호의 화력이 우세해 어렵다고 보고했다. 9월 1일에도 전투는 계속되었으다. 조선 측은 강변에서 총과 화살을 쏘았고, 제너럴 셔먼호는 대포를 사용했다. 제너럴 셔먼호에 탑승한 인원수는 적었지만 배 높이가 약 9.09미터에 달해 성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 9월 2일 새벽 제너럴 셔먼호는 양각도 하류 약 200미터 지점에 정박했다. 정오 무렵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인 한 명을 더 사살하자 수많은 조선 병사와 민간인들이 제너럴 셔먼호를 함께 공격했다.그들은 나무와 짚으로 가득 찬 뗏목을 준비하고 화약을 뗏목에 실어 제너럴 셔먼호를 향해 떠내려 보냈다. 뗏목들이 배와 충돌하자 폭발이 일어나며 제너럴 셔먼호는 불길에 휩싸여 타오르기 시작했다. 1895년 제임스 게일(James S. Gale)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불쌍한 외국인들은 이제 분노한 군중에게 찢겨졌다. 백기를 든 한두 명은 해안에 도달해 백기를 흔들며 여러 번 머리를 숙였지만 아무런 관용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들은 붙잡혀 조각조각 찢겨졌고, 그들의 잔해는 더욱 훼손되었으며, 일부는 약재로 쓰기 위해 잘렸고, 나머지는 모아져 더미로 불태워졌다.
토마스의 최후에 대한 『장계』의 기록은 토마스와 조능봉이 배에서 나와서 죽음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오시(오전 11시-오후 1시)쯤에 저들의 배에서 포와 총을 쏘아 우리 백성 한 명이 피살되자, 온 성 안에 백성들과 군인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공격하였으며 계속해서 화공선을 일제히 띄워 불을 놓아 배를 불태워 버리니 저들 중 토마스와 조능봉이 뱃머리로 뛰어나와 비로소 목숨만을 살려달라고 구걸하였다. 그리하여 즉시 사로잡아 포승으로 묶어 강 언덕으로 데리고 갔다, 이것을 본 군민(軍民)들이 울분을 참지 못해 일제히 모여들어 그들을 때려죽였다.
1867년 이 사건을 조사한 슈펠트(Robert W. Shufeldt, 1822-1895)는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 당국이 내린 금지 명령을 무시하고 평양으로 항해했고 선원들이 도발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에 조선인들의 공격을 받아 처형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VI. 제너럴 셔먼호와 토마스에 관한 이슈들
그동안 혼란을 주었던 제너럴 셔먼호와 토마스에 관한 논쟁적 이슈들을 자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너럴 셔먼호는 프린세스 로얄(Princess Royal)에서 이름이 바뀐 배였는가?
지금까지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기독교 문헌, 한미 관계 연구 및 북한 역사는 ‘제너럴 셔먼’이 미국 전함 ‘프린세스 로얄’의 새로운 이름이라고 주장해 왔다. 2005년 이 문제를 제기한 김명호를 제외하고는 제너럴 셔먼호가 다른 배일 수 있다고 주장한 학자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공식 문서에 따르면 제너럴 셔먼호로 알려진 프린세스 로얄호는 미국 군함으로 사용되다가 1865년 퇴역하고, 1868년 상선으로 개조되어 제너럴 셔먼호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1874년 침몰했다.
제너럴 셔먼호와 프린세스 로얄호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다. 첫째, 프린세스 로얄호는 1861년에 건조되어 1874년 1월 8일 오후 4시에 침몰할 때까지 운항되었다. 둘째, 프린세스 로얄호는 1868년에 사무엘 쿡(Samuel C. Cook)이 보스턴의 윌리엄 웰드 회사(William F. Weld Co.)에 매각했는데 이때 제너럴 셔먼호로 이름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이 배가 1866년에 토마스가 타고 조선에 간 배라면 그 이름은 프린세스 로얄이어야 했다. 셋째, 두 배의 크기에 대한 기록을 보면 프린세스 로얄과 조선에 간 제너럴 셔먼호는 동일한 배가 아니다. 다음 표는 조선을 방문한 프린세스 로얄과 제너럴 셔먼호를 비교한 것이다.
<표 1> 제너럴 셔먼호와 프린세스 로얄의 비교
(Unit: feet and ton)
|
|
길이 |
넓이 |
높이 |
무게 |
|
프린세스 로얄호 |
198'9"(60.6 m) |
27'3"(8.3 m) |
16'(4.87 m) |
619(619,000kg) |
|
제너럴 셔먼호 |
178'9"(54.5 m) |
49'7"(14.5 m) |
29'8"(9 m) |
60-80(60,000-80,000kg) |
특히 두 배는 무게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미국 정부의 기록에는 조선에 온 제너럴 셔먼호의 톤(Ton)수가 두 가지로 나와 있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미국 외교관 앤손 벌링엄(Anson Burlingame, 1820-70)은 미국 해군 소장 헨리 벨(Henry H. Bell, 1808-1868)에게 이 문제를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벨 소장은 와추세트(Wachusett)호의 함장 슈펠트(Robert W. Shufeldt, 1850-1934)를 조선으로 보내 제너럴 셔먼호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도록 했다. 슈펠트의 보고에 따르면 제너럴 셔먼호는 80톤급 상선이었다. 이 배에는 12파운드 대포 두 개가 탑재되어 있었고 승무원들은 무장되어 있었다. 1868년 셰넌도어(Shenandoah)호의 함장 페비거(John C. Febiger, 1821-1898)는 5월 28일 연대를 출발해 40일 동안 조선 서해안에서 임무를 수행한 후 제너럴 셔먼호는 약 60톤급이라고 보고서에 기록했다. 즉, 제너럴 셔먼호의 톤수는 60톤에서 80톤인 반면, 프린세스 로얄호의 톤수는 619톤이므로 프린세스 로얄호와 제너럴 셔먼호는 다른 배이다.
미국 남북전쟁(1861–1865) 시 북군의 장군이었던 윌리엄 테쿰세 셔먼(William Tecumseh Sherman, 1820–1891)은 현대 전쟁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 그를 기리기 위해 여러 미국의 해양 선박들이 제너럴 셔먼호로 명명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프린세스 로얄’이었다.
일본의 외무대신이었던 무쓰 무네미쓰(1844–97)가 집필한 문헌에는 제너럴 셔먼호가 ‘중국 상비군(Ever Victorious Army of China)’의 지휘관이었던 헨리 안드레스 버제빈(Henry Andres Burgevine, 1836–65)의 배였다는 기록이 있다. 버제빈은 중국 태평천국의 난 때 중국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중국으로 갔으나, 1864년 청나라 군대에 체포되어 추방당했다. 이후 그는 포르모사(Formosa, 대만)에서 외국 용병들을 모집하고, 미국 선박 제너럴 셔먼호를 인수한 후 무장시켰다. 그는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태평천국 군대와 합류하려다가 청나라 군대에 다시 체포되었다. 제너럴 셔먼호는 중국 정부에 의하여 천진으로 옮겨져 미국인 프레스턴(Preston)에게 팔렸다.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으로 가기 위해 무장한 상선이 아니라 버제빈에 의하여 중무장된 선박을 프레스턴이 구입하여 상선으로 사용한 것이다.
2. 토마스는 제너럴 셔먼호의 책임자였는가?
페비거가 제너럴 셔먼호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조선에 왔을 때, 조선 정부는 그에게 ‘토마스는 외국 배를 타고 우리나라를 불법적으로 침입했다’고 말했다. 이는 제너럴 셔먼호에서 토마스의 영향력이 매우 컸음을 시사한다. 8월 16일 정대식의 보고서에는 ‘배 안의 모든 일은 토마스가 지휘한다’는 기록이 있다. 8월 18일 유초환은 ‘토마스는 외국인의 우두머리다’고 기록했다. 한규무는 토마스를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제너럴 셔먼호의 항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로 보았으며, 따라서 토마스가 제너럴 셔먼호의 불행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토마스는 약간의 조선어와 중국어를 구사할 줄 알았기 때문에 조선인들과의 대부분의 만남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조선인들은 토마스의 중요성을 과장하여 그가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이라고 판단했다. 박규수 역시 ‘수염이 있고 조선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프랑스 병력의 선장이었다’고 기록했다.
8월 23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이현익과 신태정은 제너럴 셔먼호에 올라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눴다.
평양의 신장포구를 지나서 평양을 20리(7.8km) 앞둔 두루섬 앞의 포구에서 중군 이현익과 평양서윤 신태정이 배가 올라가서 “당신들이 끝내 노를 돌리지 않고, 또 상류로 올라오니 별도의 문답을 해야겠소” 하니 “토산품과 무역을 한 뒤에 배를 돌리겠소”라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외국과의 무역은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기에 중국 황제에 요청한 뒤에 허락을 받아야 배를 받을 수 있소. 그리고 당신들의 배가 어렵거나 부족한 물건이 있으면 공급해주는 것이 마땅하지만 무역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서양인 토마스와 조능봉은 자못 듣고 따르려는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주와 재주 두 사람이 한결같이 고집을 부리며 무역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토마스는 최종 결정을 내릴 권한이 없었다. 따라서 토마스는 제너럴 셔먼호의 선장이 아니었다. 슈펠트 제독의 또 다른 흥미로운 기록을 보면, ‘메도우스 & 컴퍼니’(Meadows & Co.)의 영국인 화물 책임자로 제너럴 셔먼호에 승선한 호가스(George Hogarth)는 상당히 ‘무모한 성격’으로 잘 알려져 있다고 쓰여있다. 따라서 평양에서 제너럴 셔먼호와 관련된 소란을 일으킨 책임이 호가스에게 있을 가능성이 있다.
3. 토마스가 순교한 날짜는 언제인가?
일반적으로 토마스의 순교 날짜는 대개의 경우 1866년 9월 2일 또는 9월 5일로 표기되지만 명확히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자료 수집과 분석 과정에서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토마스의 순교일을 기록한 주요 1차 자료는 『고종실록』과 『일성록』으로, 두 문헌 모두 1866년 9월 5일(고종 3년 7월 27일)자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기록은 평안 감사(平安監司) 박규수가 올린 『장계』를 근거로 작성된 것이다. 『고종실록』과 『일성록』의 9월 5일자에는 “평안도 감찰사가 평양 백성들이 서양 배를 불사르고 영국 사람 최난헌(토마스)을 죽였다고 보고하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평양에서 한양까지 역참제도를 이용한 장계 전달에는 약 3-4일이 소요되었다. 제너럴 셔먼호의 평양 입항 이후 박규수가 2-3일 간격으로 장계를 올린 정황을 감안하면, 긴급 상황에서 파발마(擺撥馬)를 이용해 정부와 신속히 연락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평양 대동강변에서 발생한 제너럴 셔먼호의 최후와 토마스의 사망을 기록한 평안 감사 박규수의 『장계』가 가장 신뢰할 만한 1차 자료임을 전제할 때, 토마스의 순교일은 9월 2일로 추정되며, 약 3일 후 파발마를 통해 정부에 보고되어 『고종실록』 9월 5일자에 기록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동안 학계 연구는 『장계』의 기록 시점과 전달 시차를 고려하지 않았다.
VII. 결론
토마스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조선 땅에 두 차례 선교여행을 왔다가 한국 개신교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다. 초기 한국 교회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한국의 근현대사 속에서 토마스에 대한 연구는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목적과 동기로 각기 다른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더욱이 자료와 증인의 한계, 초기 연구의 불명확성은 토마스 연구에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1980년대에 한국 기독교 역사학회는 선교사들이 기록한 한국 교회사가 아니라, 기독교를 수용한 한국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본 한국 교회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한국 교회사가 더욱 풍요로워졌다.
1866년 8월 16일 제너럴 셔먼호가 조선의 주영포에 도착해 토마스가 순교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7일이었다. 따라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만으로 토마스를 평가하는 것은 지엽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토마스에 대한 비판적인 연구들은 대부분 제너럴 셔먼호에 대한 사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이 사건의 역사적 맥락과 토마스의 역할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토마스에게 제너럴 셔먼호는 선교지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일 뿐이며, 그의 선교사적 정체성과는 구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토마스 선교사와 제너럴 셔먼호 관련 제기된 다양한 논쟁점을 고찰하였다. 핵심적인 논쟁점은 토마스를 순교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침략자로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연구 결과, 토마스가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도를 가졌거나, 선교 대상인 조선인을 경시하고 식민주의를 옹호했다는 어떠한 인상이나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조선 땅에 남긴 선교적 유산은 그의 죽음을 ‘순교’로 해석하게 한다.
토마스의 죽음을 순교로 본 초기 한국 개신교의 전통은 이어져야 하며, 한국 기독교는 1865년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입국했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무엘 마펫의 평가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더 울려퍼져야 한다.
참고문헌
고무송. 『토마스와 함께 떠나는 순례 여행-토마스 목사의 생애와 선교사역에 관한 연구』. 서울: 쿰란출판사, 2004.
『고종태황제실록』.
과학백과출판사. 『조선 전사 13권』. 평양: 과학백과출판사, 1980.
권태경. “마포삼열(Samuel A. Moffet)의 교육 활동의 전개”. 「복음과 선교」 32(2015): 13-47.
김명호. 『초기 한미관계의 재조명』. 서울: 역사비평사, 2005.
김성태. “제너럴 셔먼호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 기록”. 「복음과 상황」 7(1995).
김양선. 『한국기독교회사』. 서울: 기독교문사, 1971.
김원모. 『근대 한미관계사』. 서울: 철학과 현실사, 1992.
나동광. 『한국 최초의 순교자 토마스 목사의 생애』.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무쓰 무네미쓰. 『건건록』. 서울: 범우사, 1993.
민경배. 『교회와 민족』.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1.
민병호. 『R. J. 토마스 목사 연구』. 서울: 홍익제, 1984.
박규수. 『장계』.
_____. 『박규수 전집』 (평안 감사 박규수의 장계, 고종 3년 1866).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8.
박응규. “개항 이후 초기 한미관계와 선교사의 역할- 알렌과 헐버트를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 65(2024): 89-144.
안희열. “북한 동아기독교의 항일운동에 관한 재평가 - 1910-1945년 조선총독부 종교관련문서를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 65(2024): 145-193.
오문환. 『토마스 목사 이야기』. 서울: 지성사, 1951.
_____. 『토마스 목사 순교기념 전도 25년 사료』. 서울: 25주년 순교기념전회도회, 1947.
_____. 『도마스 목사전』. 평양: 대동인쇄, 1928.
_____. 『朝鮮基督敎會史의 一分水嶺인 平壤洋亂』. 평양: 신기사, 1923.
한규무.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토마스 ‘순교’ 문제 검토”. 「한국 기독교와 역사」 8(1998): 19-34.
Abergavenny Chronicle and Monmouthshire Advertiser, 15 February 1884.
Certified Copy of an Entry of Birth. Given at the General Register Office No 153. London, 20 June 1985.
Congregational Year Book 1868. London: Congregational Union of England and Wales, 1868.
Gale, J. S. “The Fate of the General Sherman - From an Eye Witness.” The Korean Repository 2(1895).
Goh, Moo-song. “Western and Asian Portrayals of Robert Jermain Thomas (1839-1866), Pioneer Protestant Missionary to Korea, A Historical Study of an East-West Encounter through His Mission.” Ph.D. thesis, University of Birmingham, 1995.
Griffis, Elliot William. Corea, The Hermit Nation.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02.
Kim, Yang-sön. Hanguk Kyohoe-sa Yüngu (“A Study of Korean Church History”). Seoul: Kidok Kyomun, 1971.
Latourette, Kenneth Scott. A History of Christian Mission in China.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1932.
LMS. Letter to Robert Jermain Thomas, 10 December 1866, London.
_____. Minutes of Eastern Committee, China, No.2. 14 March 1865.
_____. The Missionary Magazine and Chronicle. 1 August 1863.
Maclay, Edgar Stanton. A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Navy (1775-1901). New York: D. Appleton and Company, 1901.
_____. Letter to Messrs Meadows & Co. 8 October 1866.
Moffett, Samuel A. A History of Christianity in Asia Vol. II. Maryknoll: Orbis Books, 2005.
_____. “Evangelistic Work.” Quarto-Centennial Paper Read Before The Korea Mission of the PCUSA at the Annual meeting in Pyen Yang. 27 August 1909.
Oh, Mun-hwan. Thomas Moksa Yiyagi (“Story of R. J. Thomas”). Seoul: Jisung Press, 1951.
_____. Thomas Moksa Sungyo Kinyom Chondohoe 25nyon. TMA, 1947.
_____. “The Two Visits of the Revd R. J. Thomas to Korea.” TKBRAS 19 (1930): 93-123.
_____. Thomas Moksa-jon (“The Life of R.J.Thomas who was killed at Pyengyang in 1866”). Pyengyang: TMA, 1928.
_____. Choson Kidok Kyohoesa-ui Ii Punsuryong-in Pyongyang Yangnan (“Pyengyang Foreign Incident; A Watershed in the History of the Korean Church”). Pyongyang: Singisa, 1923.
Rees, Thomas a John Thomas. Hanes Eglwysi Annibynnol Cymru, Cyf. I (“A History of the Welsh Independent Churches, Vol.1”). Liverpool: Swyddfa ‘Y Tyst Cymreig’, 1871.
Rhodes, Harry A. History of the Korea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884-1934. Seoul: Chosön Mission Presbyterian Church U.S.A., 1938.
Silverstone, Paul. H. Warships of the Civil War Navies. Anapolis: Naval Institute Press, 1989.
Thomas, George F. Congregationalists and the Church in the Nineteenth Century. Oxford University Press, 1980.
Thomas, John. Hanes Eglwysi Annibynnol Cymru, Cyf.V (“A History of the Welsh Independent Churches, Vol.V”). Dolgellau: Swyddfa ‘Y Tyst Cymreig’, 1891.
Thomas, Robert Jermain. Letter to LMS, 1 August 1866.
_____. Letter to LMS, 31 Jan 1865.
_____. Letter to LMS, 8 Dec 1864.
_____. Letter to LMS, 5 April 1864.
_____. Candidates’ Answers to Questions: London Missionary Society. 22 July 1862.
_____. Letter to LMS, 12 July 1862.
_____. Letter to New College, 25 April 1861, London.
Williamson, Alexander. Letter to LMS, 25 Jan 1865.
http//www.kimsoft.com Lee Wha-rang, The Strange Saga of the General Sherman 1861-74. 17 July 2000. from Eric Heyl, Early American Steamers, vol. 1.
Abstract
Misconceptions and Realities:
An Examination of the Life and Martyrdom of Missionary Robert Jermain Thomas
This study reexamines the life and martyrdom of Robert Jermain Thomas, the first Protestant missionary and martyr in Korea, using primary sources that have not been sufficiently addressed in previous research. Through this approach, the study critically reviews the various misunderstandings and controversies surrounding Thomas, and empirically investigates his missionary motivations, ministry, and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his martyrdom. Over the course of Korea’s turbulent modern history, Thomas has been portrayed and utilized in different ways depending on the political contexts of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North Korea. As a result, the identity of Thomas as a martyr, which was originally recognized by the early Korean church, has been distorted, exaggerated, or diluted. The most significant factor negatively influencing the evaluation of Thomas is his association with the General Sherman. Therefore, this study clarifies the facts by examining the issues related to Thomas and the General Sherman incident. The evaluation of Thomas is carried out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not only the 17 days of the General Sherman incident, but also his entire life and the international political context of the time. Ultimately, this research aims to correct previous assessments and misconceptions about Thomas through a reinterpretation of historical sources, and to objectively present the missiological and historical significance of his martyrdom in the history of Korean Christianity.
Key-words: Robert Jermain Thomas, General Sherman, Martyrdom, Jang-kea(Record of the Pyongan Army Camp), Korean Church